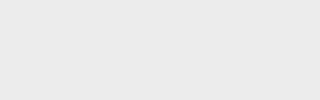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전국의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1년 전 불붙인 금융위 '난색'
영업점 폐쇄 계속되자 '은행 대리업' 필요성 다시 거론
금융위 "준비할 부분 많아"…전문가는 "점진적 도입" 제언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영업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비(非)은행이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정작 1년 전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금융위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고령층 금융편의성 위해 '은행대리업' 활용해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은행대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보는 것이다. 은행권 공동대리점을 만들어 업무를 위탁하거나, 핀테크 업체가 은행업을 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통합위에 참여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체국은 점포의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다"며 "지방의 은행영업점 폐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 점포을 통한 은행 업무 대리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1년전 불붙인 금융위는 오히려 '난색'
사실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우체국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우체국은 이미 은행권과의 협약을 맺고 입·출금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재 입출금까지만 가능한 업무 수준을 예·적금 계좌개설, 대출, 환업무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 구체적인 도입안을 발표하겠다던 금융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은행 서비스의 질 저하나 금융사고 리스크 등으로 도입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리업을 통해 발생한 금융사고까지 은행이 책임을 물어야하는 등 '리스크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은행법에 허용 근거가 있어야하는 등 법개정을 진행해야한다"면서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 은행은 계속 사라지는데…전문가 "점진적 도입" 제언
다만 금융권의 영업점 폐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은행대리업' 도입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국내 영업점 수는 2019년 3월말 기준 3547개에서 올해 3월말 2942개로 5년 사이에 605개 가량 줄었다.
서 교수는 은행 대리업의 '점진적 도입'을 제언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대출 업무까진 아니더라도, 예·적금 개좌 계설 업무 위탁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해야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이미 은행들의 예·적금 취급이 가능하므로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인·허가제가 아닌 진입규제가 약한 등록제를 통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