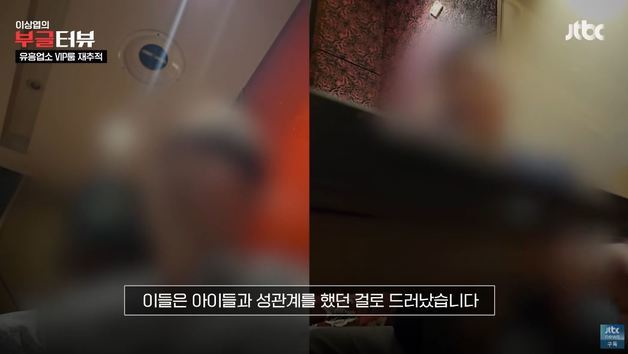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기자의눈]노동·연금 개혁안에 사라진 '숫자'…신중함인가 자신감 결여인가
'주 69시간' 홍역 치른 고용부…주 최대 연장근로 확대 구간 제시 못해
연금 개혁안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져, "핵심 파고드는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개혁'은 정치·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법적 규범이든, 제도이든 오랜 기간 굳어져온 구체제를 바꾼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험난한 여정에 나섰다.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정부의 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가장 먼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근로시간 개편' 작업은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뒤 다시 새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처음 내놓은 개편안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키며 사실상 좌초했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주52시간제 하에서 '주 단위'로 관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적용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되 업무가 몰리는 특정시점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 될 수 있는데, 과로사회로의 회귀라는 숱한 비판에 직면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설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가 있다, 상한 캡을 씌우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수치 프레임에 갇혀 개편안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때문일까.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새로 내놓은 개편안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에서도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수치 제시'는 없었다. 우스갯소리로 '숫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지난 '60시간, 상한캡' 발언을 근거로 '주 최대 60시간'이내가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언론이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 개편안을 마련 과정에 이전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처사로 이해하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논란을 빚은 첫 개편안도 논의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포함,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절충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숫자'가 사라진 개혁안은 국민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 속 23년째 유지 중인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이다.
이 같은 수치조정을 모수개혁이라 하는데,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혁과는 별개로 사실상 연금개혁의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난달 복지부는 모수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변화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문제는 '신중함'과 '자신감 결여'는 다르다.
여론을 의식해 논의과정부터 핵심을 비껴간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논의과정에서부터 개혁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쉽지 않은 개혁 괴제이지만 정부가 정공법으로 돌파하길 기대해 본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