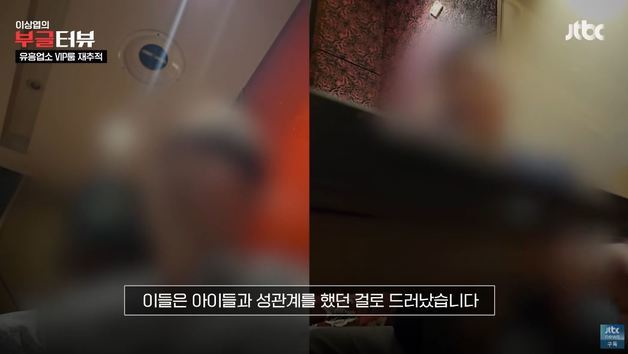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인터뷰] "TPP 없는 K-바이오 신약 개발…눈 감고 운전하는 격"
한승훈 애임스바이오 COO "K-바이오 '패스트 팔로워' 위험 수반"
"진정한 글로벌 신약 나오려면 시장 수요 맞는 포지셔닝 중요"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와 산업계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매년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 허가받은 국산 신약 가운데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승훈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COO(최고운영책임자)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뉴스1>과 만나 국산 신약 개발의 문제점을 꼬집는 질문을 던졌다. 애임스바이오는 지난 2019년 가톨릭의대 임상약리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신약개발 컨설팅 회사다.
신약 개발 컨설팅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신약후보물질을 찾기 전부터 컨설팅 전문회사를 통해 신약 개발의 기획 단계를 거친다. 신약후보물질 발굴 전에 먼저 의학적 수요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신약을 찾는 것이다.
한 COO는 이 신약개발 컨설팅의 핵심인 'TPP(Target Product Profile)'를 기반으로 한 기획부터 임상 개발까지 성공적인 상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다.
그는 "TPP는 임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약물 치료 수요에 기반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이라며 "신약개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한다.
사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장 분석과 전략 기획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질환별 단백질 타깃이나 후보물질을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독성시험, 사람세포시험, 비임상시험 등 신약 상업화에 맞는 조건들만 채우기 바쁘다.
특히 사전에 기획된 내용없이 일정 조건만 만들어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고, 묻지마 방식의 상업화 경주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즉, 모르는 길에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운 좋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요행을 바라는 식이다.
한 COO는 "신약후보물질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형인데 임상에 들어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고 검증해 실패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물질이 어떤 치료영역에서 강점이 있는지, 상품화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초기 기획 단계 고민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시장 환경 때문이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유망한 물질의 단초가 나오지 않고, 이를 상업화로 연결시킬 대안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벤처들은 글로벌 빅파마가 시작하는 연구개발 분야가 공개되고 나서야 뒤따라 가는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을 선택한다. 문제는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분야는 빠른 상업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는 신약개발 R&D 비용이 글로벌 빅파마 1개사의 평균 R&D 비용에도 못미치고, 경험도 부족해 항상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약물 계열 중 첫번째 '혁신 신약(First-in-Class)'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은 어떤 신약 개발 전략을 짜야 할까. 그는 어렵고 위험한 길보다 앞이 내다보이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단, 시장에서 상품화도 고려해 경쟁자가 적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 COO는 "신약개발 초기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업 모델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무엇보다 후기 단계에 가서야 신약 승인 요건이 판별될 수 있는 분야, 경쟁이 심한 분야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세계에서 팔리는 약을 내놓으려면 초기 TPP가 중요하다"며 "TPP가 잘 돼 있다면 해외 빅파마들도 국내 신약후보물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기술수출 성과를 이어가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