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슈퍼컴은 인텔, 크레이(Cray), HP, IBM, 엔비디아, ARM 등 외산 브랜드가 독주하고 있는 분야다. 그마나 기회를 엿보던 삼성전자도 2008년 서버사업을 철수했다. 80~90년대만 해도 정부와 민간이 나서 국산서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콤 프로젝트'다. 타이콤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로 정부 행정망의 메인컴퓨터를 국산화해보자는 취지였다.
ICT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위상이 높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주축이 됐다.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사·대우통신 등 4대 전자기업도 가세했다. 하지만 HP 등 외산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타이콤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일까? 비록 타이콤 주전산기의 시장저변 확대는 실패했지만 수많은 개발인력들은 남았다. 이 연구개발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배운 연구진들이 결국 자원이 됐다. 이 프로젝트로 매년 200명의 인력이 양성돼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등 굵직한 기술이 꽃피웠다. 또 이들은 삼성전자의 서버기술인 워크스테이션 사업부로 무대를 넓혔고 세계 1위 스마트폰을 만드는 초석이 됐다.
윤찬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타이콤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꽃을 못 피웠지만 기술과 인력으로 퍼져 있고 다른 기술개발에 영향을 줬다"며 "슈퍼컴 연구도 현 시장 구조상 특정기업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실패 경험이 있어야 성공을 찾게 된다"며 "정부 R&D를 통해 슈퍼컴을 직접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분야에 스핀오프 효과는 특히 중요하다. 옛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소련과 우주 경쟁을 벌이던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로 불리는 일이다. 미국과 아예 달에 가버리겠다는 이른바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결국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는 달착륙에 성공했다.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발달한 소형컴퓨팅 기술의 힘이 컸다. 또 아폴로에서 파생된 소형 모터기술이 접목된 것이 바로 소니의 워크맨이다.
이같은 기술의 파생효과가 크기에 슈퍼컴 분야에서도 자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슈퍼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망라하는 컴퓨팅 기술의 집약체라 중요성이 더하다.
정부가 슈퍼컴 개발을 위해 뒤늦게 대규모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 R&D를 총괄하는 미래부는 지난해 강성모 KAIST 총장을 찾아가 슈퍼컴 분야에 국산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슈퍼컴 5호기 도입을 추진하자 미래부는 외산 슈퍼컴퓨터만 수입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지난해 7월 '초고성능컴퓨팅 발전 포럼'이 출범했고 슈퍼컴 국산화 프로젝트가 수립됐다. 미래부는 기초·원천연구까지 포함해 슈퍼컴 개발에 향후 5년간 연간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슈퍼컴 개발을 위해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장우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슈퍼컴 개발은 IT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현재 한국의 슈퍼컴 기술은 미국·중국·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뒤졌지만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한국은 선두 주자에 IT 주도권을 영원히 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b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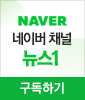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