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인수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인수위 및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3.1.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인수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인수위 및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3.1.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면서 웃지 못할 광경도 벌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대변인으로 언론 창구를 한정하면서 인수위원 및 실무위원들에겐 엄중한 함구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인수위 업무에 대해 박 당선인이 수차례 '입단속'을 강조하자 인수위원들은 "모르겠다" "입이 없다"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라" 등의 말을 반복하며 취재진을 경계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분과 회의를 끝내고 건물을 나서던 한 인수위원은 밖에서 일명 '뻗치기(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것)'를 하던 기자 8명과 맞딱드렸다. 취재원을 만난 기자들이 반색하며 다가가자 이 위원은 당황한 듯 "저는 모른다"며 뛰다시피 주차된 차에 올라탔다. 곧 시동을 건 인수 위원은 후진을 하려는지 뒤를 살피며 가속페달을 밟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차는 요지부동이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엑셀을 밟았던 것.
이를 알아챈 기자들이 허둥지둥하는 인수 위원에게 "사이드를 안 내리셨다"고 소리쳤고, 그는 그제서야 멋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현장 기자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곧 "그렇게 도망갈 필요까지 있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날 오후 분과위 회의 중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온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는 '전화 좀 받아달라'는 기자들에게 "휴대폰을 아예 안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기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걸 또 가려 받자니 양심에 찔린다. 그래서 아예 안 받으려고 차에 뒀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그럼 집에 가실 때나 전화를 확인하시는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2~3시간에 한번씩 차에 가서 무슨 전화가 왔나 확인만 한다"고 겸연쩍게 웃었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 참석하던 김현숙 여성문화분과 위원은 인사를 건네는 기자들에게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종종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하다 그를 따라가는 기자와 엉켜 구두가 벗겨지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로 유명한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은 전날 인수위 브리핑룸을 찾아 "저쪽(비서실)에 가면서 '외과수술'을 해서 입을 없애 버렸다"며 "비서는 귀는 들리고 입은 없다. 이제 제가 떠들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열린 인수위원 워크숍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며 "기사거리가 안된다. 신경쓰지 마시라"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첫번째 전체회의에서도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무질서하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설치한다고 보도한 것을 거론, "기사를 봤는데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수위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부탁"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주재한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직권 남용 및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chacha@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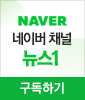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