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장 경선에서 새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4.4.1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장 경선에서 새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4.4.1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우여곡절 끝에 기초선거 무공천 덫에서 빠져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개혁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安心'(안심·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 논란으로 개혁공천을 빌미로 안 대표측 사람들을 전략공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기초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수로 개혁공천을 내세웠다.
개혁공천을 통해 최적, 최강의 후보를 추려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인데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물갈이'의 의미가 짙다. 이 같은 개혁공천의 칼 끝은 즉각 호남으로 향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지지기반이었던 만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호남에서만 현역 30% 이상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기조가 안 대표측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거세져 가는 형국이다.
특히 현역의원 5명이 안 대표측 사람인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 광주발(發) 개혁공천 논란은 향후 부정경선 후폭풍이나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대목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예상 가능했던 갈등이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갈등은 안 대표측 사람이 포진해 있는 경기에서 먼저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서의 갈등은 경선룰이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교육감이 안 대표측 사람인 만큼 김 전 교육감이 유리하도록 경선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교육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경선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이런 가운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은 안심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더욱이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언한 국회의원 5명 가운데에는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박혜자 최고위원과 장병완 정챙위의장이 포함됨에 따라 안 대표의 의중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혁공천은 안 대표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후퇴로 인한 수세 국면을 돌파하고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놓기 힘든 지방선거 카드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앞장서'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질 각오라는 시사다.
따라서 안 대표로서는 개혁공천의 기조를 굳건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개혁공천의 방법론을 두고 계파간 갈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노 진영의 좌장 격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산행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무공천처럼 개혁공천을 갖고 지나치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개혁공천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다"라며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사람 세우기, 자기편 세 불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강기정 의원은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명 의원의 지지선언은 전략공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6·4 지방선거가 광주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광주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광주는 어디로 가야하고 어떤 가치를 지녀하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윤장현이란 후보가 해달라 요구한 것이 전부"라며 "손학규 고문도 광주 5명의 의원들이 왜 도대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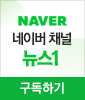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단독] '1988년 8월 18일생' 지드래곤, 8월 전격 컴백…복귀 후 곧 투어도](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12/25/6395536/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쿵푸팬더4', 8일 연속 1위…100만 관객 눈앞 [Nbox]](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8/660355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